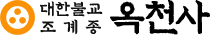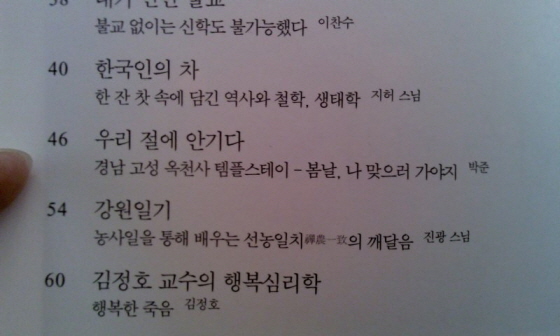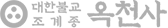월간 "불광" 4월호에 옥천사 템플스테이가 소개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템플팀장 작성일12-04-13 19:10 조회7,770회 댓글0건본문
.
봄날, 나 맞으러 가야지
-詩 그리고 템플스테이
(박준. 시인.)
나는 이 골목을 서성거리곤 했을 붓다의 찬 눈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고향을 기억해낼 수 없어 벽에 기한 떨곤 했을, 붓다의 속눈썹 하나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나는 겨우 음악이 된다
나는 붓다의 수행 중 방랑을 가장 사랑했다 방랑이란 그런 것이다 쭈그려 앉아서 한 생을 떠는 것 사랑으로 가슴으로 무너지는 날에도 나는 깨어서 골방 속에 떨곤 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두 눈은 강물 냄새가 난다
-김경주, 「내 워크맨 속 갠지스」 부분
나도 방랑을 사랑한다. 내가 주로 하는 방랑은 낯선 도시에 혼자 가서 숙소를 잡고 며칠이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여행이라 불러도 좋고 도피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 동안 중국음식만 배달시켜 먹으면서 면벽수행(?)을 하다보면 그제야 나는 내가 떠나온 곳이 그리워지고 성가시기만 했던 인연들이 다시 보고 싶어짐을 경험한다.
오늘은 경남 고성으로 간다. 고성에는 상족암(床足岩)의 호수 같은 바다에서 며칠을 머물렀던 나의 어느 가을날이 있고 연화산이라는 고운 이름의 산이 있고 그 산 밑, 연꽃의 가장 안쪽 잎처럼 맑게 돋아 있는 옥천사가 있다.
템플스테이, 평소 이 절 저 절을 가리지 않는 탓에 절에 머문 적은 많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나는 최근 들어 절에 가도 법당에 발을 들여 놓는 법이 없었다.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관음전 앞을 지나며 으레 눈을 질끈 감았다. 부처 앞에 서면 나는 자꾸 무엇을 빌고 소원하게 되는데 내가 빌곤 하는 그것들이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민망하고 염치가 없는 욕망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죄를 짓는 일 같이 슬펐다. 먼저 세상을 떠난 좋은 사람들이 걱정되어 명부전 불전함에 지폐 몇 장을 넣고 조용히 절을 하고 나오는 것이 전부였다.
옥천사에 들어서자 템플스테이를 관장하는 성각 스님과 이파랑 법우가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다.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대사가 화엄십찰(華嚴十刹) 중 하나로 창건한 절이다. 청담 스님이 출가한 본사답게 자방루 앞 넓은 마당에 청담 스님의 사리탑과 탄허 스님이 직접 짓고 쓰신 탑비가 있었다. 하나같이 오래된 전각들이 한 데 모여 폐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내는 조선 불교의 소박하고 수행 중심적 모습이 잘 드러나 있었다. 솔직히 이렇게 작으면서 하나 부족함 없이 지어진 절은 처음이었다. 심지어 대웅전 뒤뜰에 있는 독성각과 산령각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는 일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조병화, 「해인사」 부분
옥천사는 작아서 좋았고 옥천사의 템플스테이는 적어서 좋았다. 1박 2일 동안 함께할 분들은 나를 포함해 총 여섯 명이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왔고 나처럼 이곳저곳에서 상처를 받고 지쳐 있는 듯한 분도 있었고 산사처럼 고요한 분도 두엇 있었다. 함께 따듯한 차담을 나누고 경내를 둘러보고 저녁 공양을 하고 예불을 드리는 일정이 옥천각의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렀다. 다들 처음 만났지만 그래서인지 아무도 서로의 마음에 누(累)가 되지 않았다.
이번 템플스테이의 테마는 ‘봄내음’이었다. 정월달에 ‘해맞이’가 열렸고 4월 중순에는 ‘얼레지’로 열릴 예정이니 옥천사의 템플스테이는 이 우주의 순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했다. 물론 매월 넷째주마다 ‘마음챙김’템플스테이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시도 때도 없이 머물 수 있는 휴식형 프로그램도 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염주를 한 알씩 꿰는 소원주 만들기와 달빛 포행의 시간이 이어졌다. (내 무지(無知)가 만든 일이지만 나는 소원주라는 말을 듣고 옥천사의 샘물로 과일주나 곡주를 담그는 것이라 순간 오해한 적이 있다.)
달달한 옥천각의 샘물만큼이나 특히 좋았던 것은 명상의 시간이었다. 어렵기만 했던 명상의 길을 성각 스님은 정갈하게 이끌어 주었다. ‘과거의 상(像)에 머물고 집착하는 순간이 지옥이다.’라는 스님의 말이 나는 좋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싫었다. 시와 문학은 어쩌면 불교적 수행에 가장 반(反)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문학사에서 자주 손꼽히는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은 “인간은 문학작품에서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문학은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쾌락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자면 문학은 한 개인의 고통이나 슬픔을 타인에게 전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인과 작가들은 가장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가장 불행했던 기억을 끊임없이 현재로 데려와 재생시키거나 변형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독자들과 함께 그 불행의 순간들을 다시 하나하나 맛보며 어떤 카타르시스(catharsis)나 정화를 경험한다.
나도 문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런 문학의 방식은 얼마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가? 그에 반해 마음을 구하는 불교의 수행법은 얼마나 현명하고 간결한가? 다만 문학의 방법은 비교적 쉽고 불교의 수행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하긴 문학은 기껏해야 작가 자신만을 겨우 구하는 것이고 불교는 우주 만물을 구하는 것이니 애초부터 비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편백나무 숲을 참가자들과 함께 걸었다. 끊길 듯 다시 이어지는 좁은 숲길을 걸으며 나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불멸』 중 한 문장을 떠올렸다. “길. 그것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지의 띠다. 도로는 한 지점을 다른 지점과 의기양양하게 연결하는 하나의 단순한 선이라는 점에서 길과 구분된다, 길은 공간에 대한 경의다.”우리는 그 길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발끝에서 부터 머리끝까지 길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걷기도 했다. 추위가 아직 물러가지 않았다지만 삼월의 편백나무 숲은 생명이 무성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황토를 꽉 움켜진 편백나무의 뿌리들이 수액을 가지 끝으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작년에 떨어진 낙엽을 덮고 올해의 새싹들도 자라고 있었다.
편백나무에 둘러싸인 너른 공터에 앉아 다시 명상을 시작했다. 주객(主客)의 분별을 지우고 욕심도 지우고 인연도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지우는 것이 수행의 한 목적이라면 나는 불행하게도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했다. 다만 슬픔도 기쁨도 없이 아무 생각 없는 나를 만났을 뿐이다. 따지고 보면 부처를 만나야 부처를 죽이고 나를 만나야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만난 내가 반가웠다. 올라오는 길에는 다음과 같은 시를 적었다. 오랜만에 만난 봄날이었다.
저녁이면 연화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근처 석재상에서 일하는 석공들은 오후 늦게 일어나 울음을 길게 내놓는 행렬들을 구경하다 밤이면 와불(臥佛)의 발을 만든다 아무도 기다려본 적이 없거나 아무도 기다리게 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돌의 발, 나란히 놓인 것은 열반이고 어슷하게 놓인 것은 잠깐 잠이 들었다는 뜻이다 얼마 후면 돌의 발 앞에서 손을 모으는 사람도, 먼저 죽은 이의 이름을 적는 사람도, 촛불을 켜고 갱엿을 붙여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돌도 부처처럼 오래 살아갈 것이다
-박준, 「연화석재」 전문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